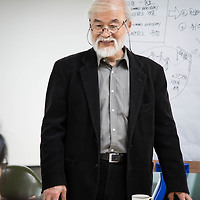서울에서 '방사능' 측정하기
- ‘원전’이라는 도박에서 벗어나는 방법
"느낄 수 없는 것은 돌보지도 않는다."
레베카 솔닛, <멀고도 가까운>
‘원전’이라는 불공평한 도박
한 강의에서 들었던 일화다. 어린 시절, 형제가 많았던 강사는 깔끔한 성격이라 늘 혼자 치우기 바빴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눌렀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치우는 사람,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냐”며 동생들에게 화를 벌컥 내던 그때, 그의 어머니가 조용히 그를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 “얘야, 세상에는 치우는 놈이 따로 있단다.” 삶을 통달한 듯한 그 대사에 모두 웃었지만, 웃음의 뒷맛은 씁쓸했다. 그녀의 생각이 처음부터 그리 체념적이진 않았으리라. 그것은 ‘공평한 노동’을 주장하는 것조차 다시 노동으로 돌아오는 현실에서 그녀(들)가 취한 나름의 생존 전략이다.
전기(電氣)는 모두가 쓰지만, 원전의 위협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극소수다. 사람의 마음은 위협을 느낄수록 더 냉담해지기도 한다. 그래야 미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고맙게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원전이 안전하다”고 말해왔다. 일본 정부 역시 늘 원전이 완벽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간편하게’ 그 말을 믿었다. 그러나 그 말은 도박이었다. 2011년 3월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다. 방파제 높이는 5.7m였고, 그날의 쓰나미 높이는 15m였다. 방파제가 더 높았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 언제 그 이상의 쓰나미가 덮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날의 쓰나미 역시 천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높이였다.
‘켄스케(일본 비전화공방 부대표)’는 원자력 사업 자체가 ‘도박’이라고 말한다. 이 도박은 ‘이익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르다. 그리고 치뤄야 할 대가가 크다. 지금이야 지진과 쓰나미가 잦은 일본에서 바닷가에 원전을 지은 것 자체가 황당하지만, 사고 이전에는 "원전은 안전하다. 사고는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켄스케는 전제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원전 사고는 바로 지금 당장에라도 일어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일본
“방사능 시민측정실”
도박의 대가는 컸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 전역을 순식간 패닉 상태로 만들었다. ‘당장 떠나야 한다. 일본 전체가 괴멸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여전히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재난은 사람들의 마음을 극단으로 몰아세웠다. 켄스케는 둘 다 모두 위험하다고 말한다. 괜찮다고 믿는 건 무지한 채 피폭을 당할 위험이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일본을 떠나는 것 또한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는 일이다. 보통 때라면 당연히 좀 더 안전한 쪽에 기준을 두고 움직이는 게 맞다.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위험하다는 사실을 은폐해서도 안 되겠지만, 위험만 강조하다 보면 ‘나만이라도, 우리 가족만이라도’하는 태도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재난으로 가장 고통받은 지역의 거주민들은 ‘낙인’으로 인해 이후 더한 사회적 고통을 겪어왔다.
켄스케가 바라본 ‘원전 이후의 일본’도 그랬다. 후쿠시마에 사는 사람이라고 모두 피폭을 당한 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들이 기형아를 낳을 거라고 말했다. 실제 파혼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후쿠시마에 가지 않는다든가, 다녀온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기도 했다. 사람들은 사고 지역의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음으로써 ‘가짜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했다.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위험’에서 자신은 벗어났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공해병’이 있었다.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것이 지역에 대한 낙인으로 작동했다. 켄스케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시민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사실 원전 사고의 영향이 후쿠시마에 한정된 것도 아니었다. 방사능은 바람을 타고 움직인다. 일본의 비전화공방이 있는 나스 지역은 후쿠시마로부터 직선으로 100km 떨어져 있다. 하지만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오기 때문이다. 유통되는 먹거리 역시 안심할 수 없다. 다행히도 일본 전역에서 통렬한 반성이 일어났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사능에 대한 지식과 정확한 측정 방법을 알고 이제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방사능 시민측정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측정실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사능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통계학과 컴퓨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이곳에서는 방사능을 연구하고 측정하며. 그 결과를 지도로 만들어 공유한다.
서울에서 ‘방사능’ 측정을 하는 의미
지난 4월 비전화공방서울에 온 켄스케(일본 비전화공방 부대표).
비전화공방 제작자들에게 방사능 측정기가 필요한 이유와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한국은 아직 대형사고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사능 측정을 한다는 건, 아주 지성적인/지혜로운 선택이다. (켄스케, 방사능 측정기 강연 中)
방사능은 굉장히 까다롭다. 미세먼지 역시 당장 해결하기 어렵지만, 눈으로 보고 코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방사능은 그런 방식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더구나 극미량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정밀한 측정기가 필요하다. 게다가 바람으로도 쉽게 확산되기 때문에 얼마나 확산됐는지 계속 살펴야 한다. 원자로가 붕괴한다거나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는 게 다 확률적인 문제라 통계학에 대한 지식 또한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증상이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게 방사능 때문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백혈병에 걸리면 그게 방사능 때문이라는 걸 증명하기 어렵다. 방사능은 인력으로 중화시킬 수도 없다. 아주 오랜 시간 없어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비전화공방은 원전 제로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원전이 당장 없어지지 않으니 현실적인 대비 또한 필요하다. 최소한 일상생활에서 방사능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실천이라고 켄스케는 말한다.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원전은 완벽할 수 없다. 원전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이 시작하기 가장 좋을 때다. 수치를 재보는 일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각자가 직접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토양과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 측정 경험을 쌓아야 사고에 대비할 역량도 키울 수 있다. 변화를 위해 당장 치루어야 할 고통이 있겠지만, ‘고통에도 목적은 있다. 느낄 수 없는 건 돌볼 수도 없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레베카 솔닛, <멀고도 가까운>)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고통을 겪은 뒤 일본인들은 전문가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치우는 사람과 어지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니다. 불행일까, 다행일까. 방사능은 치우는 사람과 어지르는 사람을 분간하지 않는다.
비전화공방 서울에 설치된 방사능 측정기
제작자들은 측정기 사용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다.
취재/글/편집 우민정
사진 이재은, 김다연
'비전화저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6. 냉장고로부터 음식을 구해 내자! (1) | 2017.06.07 |
|---|---|
| #5. 돌가마 터 잡기 : 맛있는 빵 냄새가 피어나는 곳 (0) | 2017.05.23 |
| #4. 3만엔 비즈니스 (0) | 2017.05.19 |
| #2. 후지무라 강연 “전환기 이후의 삶” (0) | 2017.05.03 |
| #1. 비전화공방, 바라는 삶의 시작 (0) | 2017.05.02 |